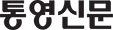정한식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같이 자리하다 보니, 80대, 70대 그리고 나는 60대의 나이이다. 세 사람이 통영의 뒷골목 항남동의 다찌집에 자리 잡은 시간은 오후 6시였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벌써 자리가 제법 차 있고 주인처럼 보이는 아주머니는 연신 바쁘게 각 테이블을 돌면서 한 잔의 술을 같이 나누고 있다. 좌석마다 무슨 주제인지는 모르나 모두가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모두가 즐거워 보인다. 통영의 그 시인의 시(詩)는 너무 난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투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포문이 되어 국내 여러 시인들의 문학성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 ‘시대적인 아픔을 담아 내지 못한다. 서정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한다. 주제가 분명하여야 한다. 독자 편에서 읽기 쉬워야 한다.’ 등의 논쟁이 계속된다. 다소는 거친 논쟁을 이어가면서도 소주잔은 계속 부딪쳤다. 급기야 70대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잡으며 초정의 ‘봉선화’ 시를 읊조렸다, 그리고 시는 이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자 80대는 술잔을 들고는 청마의 ‘깃발’을 암송한다. 문학인의 친일에 대한 논쟁도 빠지지 않았다. 음식은 주문하지 않아도 적당히 나온다. 무슨 음식이 나올지는 순전히 주인의 마음이다. 밤 10시의 항남동 뒷골목은 한산하였다. 경기가 좋지 못한 것인지 사람들이 신도심에서 노는지는 모르겠다. 한가로운 밤 풍경을 온전히 담아낸 강구안의 포장마차에서 ‘우짜’를 한 그릇씩 시켰다. 우동과 짜장을 섞은 것이니 우동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다. 아니 우동도 되고 짜장면도 되는 셈이다. 통영의 술꾼들은 늦은 시간 숙취용으로 우짜를 즐긴다. 우짜 국물까지 다 먹고 나면 속이 풀리는 것이 확실하다. 몸은 비틀거리지만 기분은 좋다.
통영 도심에서 10분만 움직여도 바다가 보인다. 배를 타고 연화도, 욕지도, 매물도, 사량도, 학림도 등 통영이 품고 있는 수많은 섬 여행을 할 수 있다. 바다가 품은 육지인지, 육지가 품은 바다인지 모르겠다.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찻집 그리고 갤러리도 만날 수 있다. 공짜로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는 곳이 즐비하다. 문학관,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등 곳곳에서 예술이 살아난다. 입장료 받는 곳도 없다. 박경리, 유치환, 김상옥, 유치진, 전혁림 같은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예술인들을 기억하는 문학관 또는 생가가 있다. 평림 일주로의 중간쯤에서 차를 세우면 머나먼 사량도까지 볼 수 있다. 물안개가 내려온 산, 섬 그리고 그 가운데 바다가 자리하고 있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통영 사람으로 폼을 잡기도 한다. 또한 운전을 육지로 조금만 하면 논, 밭, 산 그리고 과수원을 만날 수 있다. 갖가지 색상의 수국이 논두렁이며 냇가에 지천을 이루고 있고, 예쁜 색상을 가진 조그마한 의자에 걸터앉으면 누구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
때론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육지, 육지를 그리워하는 바다가 어울리는 통영에서의 시간은 모두를 안아준다. 고마운 통영의 시간이 오늘도 나와 같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