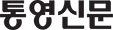일찍 시작한 하루는 쓸 것이 참 많다
노곤한 오후에 접어들면 나도 모르게 ‘오늘은 하루가 참 길다.’고 일찍 일어나서 여유로운 것을 간혹 잊기도 한다. 이런 날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한다. 그나마 출퇴근이 자유로운 나는 아직 해가 남아 있는 요즘의 초여름 시간을 좋아해서 천천히 걷기도 한다. 집으로 오니 온통 초록 속에서 유난히 환한 더미가 보인다. 절정을 맞은 장미. 보통 장미와는 다르게 송이가 작고 분홍과 흰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사랑스런 꽃이다.
라벤더드림, 베이비핑크, 더블오렌지칵테일, 스위트드림, 스칼렛메이딜란트, 벨벳, 브라이드, 싱글오렌지 칵테일, 체리칵테일.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진 미니장미. 찔레 장미라고 하는 꽃이다. 종류를 보니 우리집 찔레장미는 스위트 드림이라는 종류다. 한자어로 미몽迷夢. 딱 내게 맞춘 꽃인 듯하여 더 애착이 간다.
우리집도 그렇듯 생울타리로 많이 쓰는 이 장미는 덤불을 이루고 있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초겨울까지 개화가 이어진다.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꽃덤불이다.
늘 그렇듯 얼굴을 꽃 속에 묻다시피 해서 흠씬 향을 맡는다. 향은 달콤하지 않고 뭔가 뭉근하게 스며든다. 어느 글 속에서 흔히 묘사하는 그런 장미향은 분명 아니다. 꽃집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심지어 말린꽃에서조차 나던 향기 진한 장미를 접한 거 빼고는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맡은 장미향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다른 향은 나를 이끈다. 더 깊이 맡아 보도록, 조금 더 몰입하여 다가서도록 한다. 앙증맞게 유혹하는 찔레장미의 향을 자꾸 맡으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장면이 머리속에 펼쳐질 때까지 몰입한다. 마치 향기요법을 시도하는 것처럼.
찔레장미는 내게 미몽 속에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꽃이다.
어릴 적 풀숲에 몸이 묻히도록 뒷골밭으로 가는 길은 비가 오면 그대로 도랑이 되는 비좁고 작은 고랑길이었다. 그 속을 걸어서 밭으로 가고, 엄마 심부름도 가고, 눈이 큰 소를 몰고 풀을 먹이러 산으로 갔다.
그럴 때마다 풀이 가득차고 물이 흐르기도 하는 그 고랑 같은 길이 너무 무서웠다. 뒤에서 보면 까만 머리만 보이는 길은 밭보다 낮았다. 할아버지가 소꼴을 벤다고 낫질을 하기 전까지 온 식구가 그 길을 걸어다녀야만 했다. 뱀이 나와서 허리를 감을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어깨며 목을 물어뜯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이 계절 쯤 맡아지는 향기.
분홍이 얼핏 보이기도 하는 하얀 찔레덤불에서 나는 풀냄새 섞인 꽃향은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고, 아주 연한 민트향이 섞인 듯하였다.
그 향은 두려움 속에서 걷던 좁은 밭도랑길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오늘처럼 그때 내 유년의 밭두렁 찔레꽃향과 닮은 찔레장미향을 맡으니 내 고향과 찔레향을 맡은 산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안도하며 가던 뒷골밭의 풍경과, 산에 담긴 하늘을 이고 앉은 엄마의 등에서 나던 노곤한 땀냄내가 그립다.
아직 섬집에는 그때 엄마가 쓰던 세월에 닳아져 뭉둥해진 호미도 있고, 챙사이 사이에 혹여 남아 있을 엄마의 지문이 박힌 삭아가는 바구니도 있다.
산 너머 해를 넘어가는 이 시간에 묘하게 가슴에 스미는 뻐꾹소리는 사친의 그리움을 더욱 깊게 한다.
완춘은 끝났고 성하가 시작되었다.
정 소 란 (시인. 통영문협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