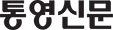서피랑하우스 양수폰 씨

서피랑공원 입구에 있는 이국적인 카페 ‘서피랑하우스’는 생긴 지 2년 만에 서피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냉커피 2000원, 여름날 서피랑언덕을 찾은 사람들은 서피랑하우스에서 목을 축이고 박경리와 이중섭의 체취가 묻어 있는 서피랑을 오른다.
서피랑하우스의 주인장은 한국생활 25년차의 태국인 양수폰 씨다. 아무것도 없던 서피랑 언덕입구 작은 이층집에 살던 양수폰 씨는 서피랑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집과 연결해 카페를 만들었다.
“친구한테 이 집 샀어요. 원래 지붕만 있었어요. 나, 벽 세우고 카페 만들어요. 한 번에 다 안 돼. 돈 생겨서 요거(한쪽 벽) 만들었어요. 돈 생겨서 또 요거 만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 ‘아, 또 바꿔, 예쁘다.’ 아, 진짜 힘들다. 공사 끝났어요. 색깔 빠졌어요. 내가 쪼깸쪼깸 칠한다. 예쁘다 때문에 동네 사람 좋아요(건물이 예뻐져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양수폰 씨의 감각으로, 멋없던 2층 집은 추억 가득한 게스트하우스로, 차양뿐이던 마당은 오두막처럼 포근한 카페로 거듭났다.

“사람들 말해요. ‘왜, 이런 집 샀어?’ 내가 꾸미고, 사람들 말해요. ‘와, 잘샀어. 너무 예쁘다.’”
카페의 창문 하나, 얹어놓은 소품 하나도 모두 양수폰 씨의 감각이 묻어 있는 작품이다.
양수폰 씨는 얼마 전에 여덟 평짜리 집을 하나 샀다. 쪽문 하나를 의지한 단칸방이 전부인 작은 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폰 씨는 이 집도 동화 속에 나옴직한 예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아무리 봐도 집 여섯 평. 여덟 평 아니야. 시청에 가서 우리 집 땅 알아보고, 이만큼 넓게. 내가 만들었어요. 원래 여기 없었어.”
양수폰 씨는 평상으로 만든 침대 뒤쪽으로 두 평짜리 세탁실을 만들었다. 현관 위에 수납공간을 만들어 간이커튼을 달고, 신발장의 반은 옷장으로 삼았다. 작은 싱크대와 렌지 하나, 싱글침대보다 작은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여덟 평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쓰임새가 좋은 집이 됐다.
이 집도 지인들은 “쓸모없는 집을 왜 샀느냐?”고 걱정하다가, 이제는 “너무 멋지다.”며 감탄을 한다. 양수폰 씨는 이 작은 공간에서 행복하다.

25년 전, 양수폰 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오게 됐다. 국제결혼이 흔하지 않은 때, 여행에서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친정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친정 식구, 모두 공무원. 아버지랑 다섯째 언니는 경찰, 나머지는 공무원. 그런데 나 공무원 하기 싫었어. 호텔에 근무했고, 재미있었어요. 혼자 한국사는 거 걱정 많았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
남편 하나만 알고 시작한 한국생활.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말을 모른다는 건,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까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다. 태국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왔다.
“남편, 레미콘 기사. 회사 어렵다. 네가 사라. 집 팔아 레미콘 샀어요. 나는 횟집에서 장사하고, 남편 레미콘. 남편 술 많이 먹고 술 깨면 미안합니다, 한번 받아주면 또 술 먹고, 똑같다. 때문에 많이 싸와요. 소주 먹고, 면허증 취소 했어요. 남편 레미콘 못 해요. 같이 장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같이 횟집에서 일하는 동안,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속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과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 속에서 2005년, 양수폰 씨는 이혼을 했다.
아프지 않은 이혼이 어디 있으랴. 이혼 소송을 하는 기간은 무인도에 불시착한 표류인처럼 무섭고 막막한 세월이었다.
그러나 고맙게도,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삶의 상처를 보듬고 흘러 주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랑 둘이 살기 시작한 아들은 어느덧 군대도 다녀온 장성한 어른이 되어, 일터 가까운 원룸에 산다.

양수폰 씨는 지금 결혼이민자들의 맏언니를 자처하며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산다. 이 옷은 누구에게 딱 맞겠다, 이 물건은 누구에게 꼭 필요하겠다, 양수폰 씨의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외국인 동생들과 나눌 것들이다. 한글학교 수업을 한 날에는 서피랑하우스에서 동생들과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양수폰 씨는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북신동 새마을부녀회에 속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통영시민의 한 몫을 하고 있다.
“나 그거 알아요. 외국에서 시집 온 동생들, 힘든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 못해. 친정 너무 멀어. 말하면 걱정 많아. 말할 데 어디 없어요. 외국 사람 도와 있으면 내가 준다. 우린 형제가 없으니까.”
어렵고 고독한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양수폰 씨는 외국인 동생들에게 든든한 언니가 되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