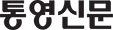조석규 신성수산 대표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를 일터삼아 평생을 살아온 신성수산 조석규(61) 대표의 깨달음이다. 사람은 하고도 안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할 수 있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름 없는 모래뻘에 자라는 조개 하나도, 환경이 깨끗하면 굵고 실한 알을 품고 환경이 나빠지면 작고 오그라든 알을 품는다.
“바다가 없으면 통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만 해도 바다에 기대 먹고사는데, 바다가 황폐해지면 먹고살 길이 없어지지요.”
정화장치로 걸러낸 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굴 패각에서 코팅사를 제거하는 것도 바다와 공생하기 위한 조석규 대표의 노력 중 하나다. 환경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는 경남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바다를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석규 대표는 도산면에서 태어나서 도산초중학교를 나오고 동원고등학교(당시 상업고)를 나왔다. 10년 동안 일한 부산의 직장도 수산 관련 회사였다.
30년 전에 통영으로 돌아온 조 대표는 산양면에 있는 굴 가공공장에서 26년 동안 일했다. 그리고 2018년, 고향인 도산면에 신성수산을 차렸다. 굴을 채취해 와서 박신하여 판매하는 가공공장이다. 가공한 생굴과 각굴은 냉동업체로 납품하기도 하고 전국으로 택배도 한다.
조 대표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4시에 출근해서 5시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 굴을 채취한다. 조 대표를 비롯한 채취조는 주로 자란만에서 자란 굴을 가져온다.
그 시각, 신성수산에서도 박신 기술자들이 굴을 까기 시작한다. 박신장에서는 새벽 4시부터 저녁 4시까지 50~60명의 기술자들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오전에 깐 굴은 정오에 열리는 굴 경매에, 오후에 깐 굴은 5시에 열리는 굴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
굴 가공공장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박신 기술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계속 나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기술자 찾기가 쉽지 않다.

“사업주가 을이 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잘 까는 사람, 못 까는 사람을 가를 처지가 아니지요.”
산양면에서 공장장을 했을 때와 대표가 된 지금, 하는 일은 똑같다. 하지만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안전과 직원들까지 책임져야 하니 그 중압감은 비교할 수 없다.
4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정상궤도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평균 7톤을 작업해 나가던 굴이 4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냉동업체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니, 저희 같은 가공공장에서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가장 큰 판매처에서 수요를 줄이자 가공공장도 덩달아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언젠가 종식될 일, 조 대표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패각 처리 문제가 더 큰 골치라고 말한다.
“20년 전에 굴 패각을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굴을 꿰고 있는 코팅사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패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팅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순수한 패각만 가루로 만들어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아주 처리가 곤란합니다.”
패각으로 만든 가루는 산처럼 쌓여 있다. 햇볕을 받은 부분은 하얗게 건조돼 있고, 그늘진 쪽은 해수가 절벅절벅하다.
이 폐 패각은 원래 비료공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통영에 있는 비료공장 2곳에서는 최근 폐 패각 반입을 안 하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환경단체는 고발하고, 비료공장은 안 가져가고, 시에서는 몰라라 합니다. 굴업자들마다 패각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굴 패각이 석회비료의 원료가 되는데 왜 못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 대표는 공장에서 처리한 굴껍질을 자기 밭에 갖다 뿌려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구마가 배 이상 알이 커지는 걸 확인했다고.
“작물이 굉장히 잘 됩디다. 고성에서도 농민들이 찾아와 거름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석회비료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굴 패각은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썩는다. 악취가 나고 파리가 들끓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간다.
수요공급의 줄다리기 속에서 못 가져가는 거라면, 바다로 돌려보낼 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이렇게 굴 껍질을 쌓아두고 있다가 비라도 오면 썩은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 더 오염될까 걱정이다.
“눈을 뜨고 바다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하루 빨리 적재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잇대어 산업을 일구고 있는 사업자들은 누구보다 더 바다와의 공존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