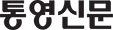정한식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거제 근포항으로 이동하여 카멜리아(Camellia)호에 승선하였을 때에는 정오였다. 승객들이 바다로 던지는 새우깡 하나라도 놓칠 새라 갈매기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우리 배가 장사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새우깡을 낚아채기도 하고 바다에 떨어진 새우깡을 서로 물겠다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들이 뱃길에서의 즐거움이다. 푸른 숲 속에 있는 장사도는 ‘카멜리아 섬’으로 명명되어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다. 바다, 섬 그리고 하늘이 그려내는 가을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울창한 푸른 숲 속에 숨어 있던 카멜리아 섬은 그의 속살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잘 정돈된 길가에서는 앙증맞은 작은 꽃의 인사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화려하였던 자신의 계절을 지나온 수국은 지금도 그의 꽃대를 남겨 두고 있다. 내년에 피어날 수국을 마중하고 있다고 한다. 하늘의 태양이 바다를 그리워하듯 바다 위에 그의 영롱한 빛을 소나기처럼 내려 모둠을 만들었다. 내 눈이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언제 가졌던가? 반짝거림이 바다 표면을 간지럼 하고 바다도 답하여 같이 움직여 준다. 작은 섬들과도 사이좋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윤기가 흐르는 잎 속에 숨어 있는 빨간 동백꽃을 만났다. 꽃잎에 쌓여있는 저 깊숙한 곳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양성화이다. 동백꽃은 단 한 마리의 동박새 만을 받아 들여서 수정을 한다고 하여 빨간 동백꽃은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한다. 전 세계의 동백의 효시가 ‘카멜리아 자포니카(Camellia Japonica)’라고 하며, 여기에서 만나는 동백이 바로 그것 이라고 한다. 청명한 동백숲 속의 동백꽃의 청초함이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씩 피어나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은 육지에서 만났던 동백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누에를 닮았다고 하여 ‘누에섬’ ‘늬비섬’(‘늬비’는 ‘누에’의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던 것이 일제 강점기에는 한자어로 ‘잠사도(蠶事島)’라고 하였다고 한다. 1913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측량되고 자신들의 발음이 용이한 것으로 바꾸어 ‘장사도’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죽도초등학교 장사도 분교의 옛 교정과 당시 주민의 집도 찾을 수 있었다. 그 집의 마루에 걸터앉아 그때 그분들이 보았던 바다를 바라보았다. 보이는 풍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아니겠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뀐 것은 사람이고 자연은 그대로 그곳에 살고 있다. 그분과 나는 이곳에서 교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섬과 바다의 조화로움 그리고 평화로움까지 행복한 힐링이다. 운동장은 분재 정원으로 변모하여 그때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분재 화분으로 내 옆을 지나치기도 한다. 이곳에서 만나는 옻칠미술관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통영의 옻칠그림의 대가 김성수 님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흥분된 순간도 주어졌다. 천년을 간다는 미술, 우리나라의 독특한 회화세계를 이곳에서 맞닥뜨렸다. 동백섬인 듯, 조각공원인 듯, 식물의 낙원인 듯, 생태 공원인 듯, 그곳을 오늘은 이제 떠나야 하였다.
그는 완연한 누에의 모습으로 나를 붙들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