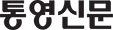미슈메이의 한국살이

친구가 한국에 막 온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한국말을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어느 날 친구가 옷을 사고 싶어 하길래 나는 친구와 함께 옷상점에 가서 같이 사기로 약속했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같이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에 있는 옷가게로 갔다. 가게문을 열었을 때 가게 사장님이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는 태도가 참 좋게 보였고 매우 친절했다. 친구는 중국처럼 상점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 옷 저 옷 많이 입어봤지만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 때 가게 사장님의 안색이 기쁜 얼굴에서 점점 화난 얼굴으로 변해 내 앞에서 불만스러운 말들을 표출했다. 그러나 친구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계속 기분이 좋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장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어쩔 수 없이 싼 옷을 하나 골라서 샀다.
가게에서 나온 후 나는 친구에게 한국의 쇼핑 문화를 소개했더니 친구는 크게 화낼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다시 그 가게에 쇼핑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상기시키려고 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고객은 하나님이다’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교회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의 뜻은 서양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고객은 대하는 태도의 의미다. 또 옷을 많이 입어보고 안 사도 고객이 갈 때의 태도가 들어올 때의 태도가 같다. “다음에 또 오실 것을 환영하겠습니다.”라고 생긋 웃으며 말한다. 또한 중국은 무게가 있는 물건은 근으로 판다. 예를 들면 수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박 한 개는 무게에 따라 한 근에 얼마인지 계산으로 정확하게 돈을 받는다. 중국의 한 근은 0.5kg과 같다. 만약에 이걸 알면 여행할 때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장날, 나 혼자 중앙시장에 갔다. 할머니에게 이 상추가 얼마인지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천원”이라고 말하셨다. 나는 상추가 신선하고 싸게 팔아 좋아서 바로 “제가 살게요”라고 말하며 할머니께 천원을 줬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준 돈을 받지 않았다. 할머니는 좀 화가 나셨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이천원”. 나는 “맞아요, 이천원.” 그 때 나는 문득 중국에서 숫자 ‘일’ 발음이 한국에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났다. 부랴부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천원을 줬다. 아이고, 오해가 또 생겼다. 만약 자국의 좋은 문화가 어디든지 통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