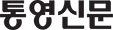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봄이다.
그러나 통영이어서 다행이다.
조금만 걸어가면 봄이 무르익은 바다가 있고, 봄꽃들이 터져 올라오는 산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으니 말이다.
삶을 답답하게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로 모두가 조심스러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과 들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봄이 코로나19의 겨울을 뚫고 비어져 나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도로 가에는 개나리가 너울졌다.

집 앞 텃밭에서는 파와 봄동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로 유채가 기웃거린다. 아직 벚꽃은 움속에 숨어 때를 기다린다.
통영의 봄은 바다에서부터 온다고 했던가. 봄기운이 도다리를 몰고 오자, 방파제에서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드리운다. 해안도로에는 오랜만에 외출한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며 봄 햇살을 받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져야 하는 특별한 계절을 지나고 있지만, 통영이어서 참 다행이다. 너와 나의 거리가 먼 가운데서도 바다 속에 나와 노닐 수 있으니.




김선정 기자
tysinm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