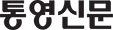광도면 복지팀 이재은, 김세령, 강민훈, 강라희

불과 반 세기 전에 우리는 먹고살 수만 있어도 ‘행복’했다. 먹는 것,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에 급급하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의 방향도 빈민을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시대를 지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렵죠.”
통영시 복지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8년차 김세령 복지사(31)의 말이다.
그 전의 복지제도는 소득 얼마 이하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에게는 얼마의 생활비, 어떤 혜택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연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지원을 ‘복지’라고 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는 점점 더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있다.
18년째 통영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해 온 이재은 팀장(43)은 이런 복지정책의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반갑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례관리’가 도입됐어요.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담하고 체크하고 결정해서 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연결해 주기도 하고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케이스마다 다른 서비스를 하지요.”
이재은 팀장은 일률적인 최소한의 경제 지원에서 벗어나 적절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좋다. 일은 더 복잡해졌지만 보람은 더 크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운 건 대상자들의 더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김세령 복지사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이게 옳은가?’를 계속 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제 판단이 다 옳다는 보장도 없고 내 가치관이 그분들에게 주입되는 것도 두렵죠.”라고 말한다.

움막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주거환경을 바꿔야 하는가? 대상자는 체납된 전기료를 내주기 원하는데, 이렇게 계속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옳은가?
새로운 사례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다행인 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것이다.
김세령 복지사와 이재은 팀장은 광도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일한다. 이들 두 사회복지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강라희(25), 간호사 강민훈(27)이 한 팀이다. 통영시 최북단인 안정에서 원문고개까지 3만여 인구가 밀집해 있는 광도면을 중심으로 도산면과 사량면의 ‘맞춤형복지’를 맡고 있다.
광도면 복지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사업 수행 우수 지자체 공모 읍면동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3,510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이 선정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통영시 광도면이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매월 1회 찾아가는 방문상담의 날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가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1대 1 후원 및 결연사업인 희망플러스 나눔 잇기 사업도 주목받았다.
이런 성과의 뒤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협의체의 박금석 위원장님이 아주 잘 도와주시고, 위원들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죠. 저희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빛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를 광도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한 ‘빛(光)과 길(道)’사업도 광도면의 선제적인 복지사업이었다. 안정·황리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도움 요청서’와 ‘복지제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회신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라리 농촌 지역은 서로 이웃간에 잘 알고 지내니까 이장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조선소 인근의 1인가구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 사업을 계획했어요.”
아무도 지침을 주지 않았지만, 이재은 팀장과 맞춤형복지팀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았다. 조선소의 폐업으로 그 원룸 어딘가에서 세상을 비관한 사람이 나올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찾아낸 대상자는 모두 21명, 복지팀은 각자의 필요에 따른 연계를 해줬다. 어떤 이에게는 기초수급급여를, 어떤 이에게는 정신보건센터를, 어떤 이에게는 장기요양서비스, 또 다른 이에게는 고용센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때로는 광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서서 청소와 살림교육을 하기도 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연계해 준 원룸에서는 며칠째 굶고 있는 20대 청년이 나왔다. 수도도 전기도 끊긴 지 오래, 취사에 필요한 가재도구도 없었다.
“햇반을 사갔는데, 햇반을 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버너를 구입해 주고 일단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어요.”

의욕도 없고 죽고만 싶다던 그 청년은 먹을 것을 먹고는 상담 태도가 달라졌다. 맞춤형복지팀은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해 주고 고용노동센터와 연결해 줬다. 다행히 그 청년은 취업이 되어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일어서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난다. 하지만 도움을 줄수록 더 의존적이 되거나 쏟아붓기만 하고 변화가 없을 때는 힘이 빠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되레 ‘왜 안 해주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특히 저희는 신분이 공무원이다보니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들의 일을 직업이라고 여기며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는 밤이 어찌 ‘직업’이기만 할까.
돕는 손과 받는 손을 연결해 주는 일선 복지팀은 잊지 않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최선의 도움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