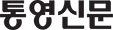정한식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8월 말로서 대학 교수로서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하였다. 이곳에 부임한 것이 1993년이니, 26년간을 이곳에서 지냈다. 마지막 수업 그리고 기말시험을 마치고 전산망에 성적 입력도 마쳤다. 퇴근길에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정이 참 많이 든 운동장, 풋볼장, 잔디, 수목 그리고 잡풀들도 반가운 모습으로 환하게 웃어 주었다. 뒷날 아침 나는 밝은 티셔츠와 가벼운 잠바를 차려입었다. 티셔츠의 목 단추도 하나만 잠그고 목을 훤히 내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겉옷 잠바의 지퍼도 올리지 않았다. 머리도 감고 대강 손질하여 가르마를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어제의 나와는 다른 청년이 나타나 있었다.
1984년에 시간강사로서 대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니, 강단에 선 시간을 세어보면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학생들 앞에 설 때에는 늘 양복 정장을 하였다. 교수 생활에서 만난 제자들 중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었고, 지금은 환갑을 넘기고 같이 세상의 동료로서 지내는 제자들도 제법 있다. 난 그분들에게 교수로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의 무게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본연의 자세에 더하여 ‘양복 정장’을 고집하였다.
아내는 늘 새하얀 와이셔츠를 준비하고 반듯한 줄도 세워 주었다.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양복을 구입하고, 넥타이도 새것으로 바꾸었다. 수업에 들어가는 날에는 늘 양복차림으로 학교에 출근하였고, 난 그것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로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양복 정장이 교수의 제복이 되었다.
이제 그 양복 정장을 벗었다. 운동화, 티셔츠 그리고 잠바 하나를 걸치고 시내를 활보하여 보니, 또 다른 세상이 그곳에 있었다. 이제는 양복 정장 입을 일이 드물 것 같다. 걷다가 힘들면 도로가에 걸터앉기도 한다. 더운 날에는 목수건 하나 걸치고 고개를 흔들면서 걷기도 한다. 시원한 통영 앞바다의 바람결이 향기를 품고 코 끝을 스친다. 연구실 창 너머 아름다운 미륵산을 품은 통영바다 그리고 운무가 미륵산 정상을 하늘에 묻혀버린 날, 때로는 용화사 풍경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되돌아보는 교직생활, 그 속에는 감사함만 남았다. 객지인 통영이 나를 안아 주었고, 많은 동료 교수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살았다. 대학의 연구실은 나를 평생 지켜주었다. 이제 양복 정장을 벗으면서 그간의 감사와 은혜에 보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