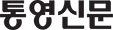통영에 뿌리내린 필리핀댁 김선희 씨

통영에 온 지 23년. 김선희 씨(54)는 고국 필리핀에서 살았던 세월만큼의 시간을 한국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말은 어렵고, 발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끼리 하는 빠른 말은 잊고 살던 ‘이방인’이라는 위치를 새삼 깨닫게 한다.
“한국 좋아요. 사람들 친절해요. 남편 잘해 주고, 아들 딸 착해요.”
외국인 주부들 모임에 가면 맏언니 격이 되는 김선희 씨의 원래 이름은 카롤리나 에스디컬. 국제결혼이 낯설던 시절에 대한민국 남단 통영, 그것도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 학림도로 시집 왔다.
“통일교 신랑신부 많아. 같이 결혼식 했어요. 카톨릭 성당에서 결혼식 했어요. 처음 남편 봤을 때, 내 눈이 이렇게(번쩍 뜨이는 몸짓을 하며) 마음에 들었어요.”

선희 씨는 상충되는 결혼식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남편 공영식 씨(60)가 설명해 준 사연은 이렇다.
“처음에는 통일교에서 소개를 해가 필리핀서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결혼식도 불법이라고 해서 몬 델구 왔지. 그거 바루는 기(고치는 게) 한 1년 걸렸어요.”
영식 씨는 필리핀 카톨릭교회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야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노인들만 50여 가구 사는 작은 섬. 살갑게 말을 가르쳐줄 사람도,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섬에서 선희 씨는 낯선 언어의 벽에 갇힌 수인(囚人)이 됐다. 그리고 점점 마음의 병이 들었다.
“살 다 뺐어요(빠졌어요). 40킬로. 임신했는데, 40킬로. 필리핀 사람 많아 없어. 할매만 있어.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와 엄마 몸무게를 합한 것이 겨우 40kg. 바싹 야윈 선희 씨는 보는 것만으로도 위태로웠다.
“삼계탕, 필리핀 음식 똑같아요. 근데 나 몰랐어. 필리핀 생각하고, 울고….”
필리핀 음식이라도 먹으면 한숨 트일 텐데, 학림도에는 아무도 필리핀 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기를 낳고 4개월이 됐을 때는 우울증이 깊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산후우울증까지 겹쳐서 욕봤지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릴라구 하는데, 우짤낍니꺼? 병원도 가보고 하다가, 결국 필리핀으로 보냈지요.”
4개월 된 아기를 딸려 친정으로 보내는 길, 어머니는 가서 안 돌아오면 어쩌느냐면서 필리핀행을 걱정했다. 그러나 영식 씨는 모계사회 문화가 몸에 밴 선희 씨에게서 아기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내는 믿었지요. 그래도 사랑 안 했나. 내가 자주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 빨리 온나.’ 하면서 기다렸지.”
친정의 햇살과 음식은 선희 씨의 건강을 되찾아줬다. 1년 만에 선희 씨는 다시 학림도로 돌아왔다. 여전히 선희 씨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영식 씨는 어렵게 이룬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 어무이도 며느리가 답답할 거 아닙니까? 한날은 내가 울며불며 어무이한테 말했어요. ‘어무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넘의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오. 안 답답하것소?’ 그 담부터는 둘이 좀 사이가 좋아지데.”
서로 이해하려고 한 발씩 양보했을 때, 가정은 조금씩 하나가 되어 갔다.
“남편, 돔하고 우럭 키워요. 아침 나가요. 시어머니, 야야 빨리 바다. 나 같이 가요. 어머니 100킬로, 나 20킬로. 어머니 대단해.”
물이 나는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개발을 하러 나갔다. 동네 어른들이 모두 집집마다 양동이를 들고 물 빠진 바다에 쭈그리고 앉아 조개를 캤다. 10kg들이 양동이 10개를 채우는 어머니의 솜씨를 선희 씨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겨우 한두 동이를 채우고도 온몸이 아팠다.

‘선희’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줬다. 선희 씨는 어머니를 따라 조개를 캐고, 김치를 담그고, 버스를 타면서 한국 사람이 되어 갔다.
“어머니 김치 맛있어. 나 김치 만들어요. 맛없어요. 어떻게. 몰라. 맛없어요. …어머니 보고 싶으다.”
23년이란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서로 품느라 아프고 기쁜 세월을 같이 했던 어머니를 데려갔고, 집안의 보물이었던 자식들을 성장하게 해 내보냈다.
“아들 어릴 때 천식, 지금 괜찮아요. 군대 있어요. 딸, 부산 있어요. 대학교 다녀요. 예쁘다. 남편 닮았어요.”
통영을 강타한 태풍 매미도 함께 견뎠고, 양식장이 부도나는 아픔도 같이 견뎠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애쓰면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금 미수동에 있는 선희 씨네 보금자리에는 이제 부부만 산다.
“남편 통영 스타일. 말 없어. 툭 말해. 다른 사람 말해요. ‘남편 무섭다’. 아닌데. 착하는데. 23년 살아 알아. 우리 남편 착하다.”

무뚝뚝한 영식 씨지만, 서로 위해주는 마음을 알기에 두 사람은 다시 찾아온 신혼살림이 즐겁다.
선희 씨는 지금 한국어교실에 다닌다. 할머니들 틈에서 혼자 배운 한국어는 시제, 어미, 활용이 다 틀려 어려움이 많다.
한국어교실에서 만나는 동생들에게 선희 씨는 “Don't Worry!”라고 말해 주고 싶단다.
“다른 사람 도와, 많이 있어요. 돈 워리. 섭섭하지 마. 괜찮아. 한국사람 착하는 사람 많아. 나 도와줄게.”
누구보다 높은 국경을 넘어왔기에, 그리고 사랑으로 그 국경을 낮은 담장으로 만들었기에, 선희 씨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다.
“Don't Wo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