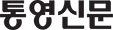옻칠비엔날레, 중간용역서 통영트리엔날레 제시
종합축제보다 통영의 지역·예술·희소성 담아야

강석주 시장은 옻칠 비엔날레를 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다. 전통공예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옻칠 비엔날레를 추진함으로써 통영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타당성 용역은 옻칠이 무엇인지, 옻칠로 비엔날레가 될 만한지를 따져 보는 용역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을 맡은 서울예술대학교 산학연구원은 ‘옻칠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대신 ‘옻칠 비엔날레’로 한정하기보다 통영의 도시재생, 문화적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비엔날레 형태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구나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가 준비 부족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트리엔날레’를 제시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영의 다양한 축제를 하나로 모으고 연계해, 예술제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통영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음악제를 비롯해 통영연극예술축제, 한산대첩축제까지 한 그릇에 담아 대규모 트리엔날레를 열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옻칠’만으로는 비엔날레의 내용이 빈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몇 번 하고 나면 밑천이 떨어질 콘텐츠를 대표로 내세웠다가는 시간이 갈수록 짐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젊은층에게 매리트를 줄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국내든 국외든 비엔날레 참석자의 상당수가 20~30대인데, 그들이 ‘옻칠’이라는 주제에 매력을 느끼고 통영을 찾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한계를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통영국제트리엔날레’다.
그러나 종합선물세트 식의 트리엔날레가 통영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전국 어느 도시나 할 수 있는 개성 없는 축제가 될 우려가 있다. 섬과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묶어 내놓은 비엔날레에 ‘목포’나 ‘남해’의 이름을 붙여보면 자명해진다. 그곳에도 섬과 문화예술과 축제가 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통영’의 비엔날레가 되려면 통영 아니면 안 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옻칠’은 아주 중요한 통영의 알맹이가 될 수 있다.
조선의 군사계획도시인 통영의 최초 원주민은 통제영 휘하의 군인들, 통제영의 예인들, 통제영 산하 12공방의 장인들이다. 12공방의 중심에 옻칠을 하는 상하칠방이 있기에, 옻칠을 통영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옻칠만으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걱정했다. 그러나 12공방의 모든 공정에 옻칠이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옻칠의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다. 옻나무, 도료, 천연염색, 유물, 식품, 전통공예, 현대회화, 생활용품, 교육 등 옻칠에서 파생해 박물관을 만들 만큼의 분야가 수두룩하다. 이 각각이 그 해 열리는 비엔날레의 주제가 된다 해도 손색이 없다.
‘젊은이들에게 매리트가 없다’는 우려는 오히려 자존심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옻칠 비엔날레가 뭔데?” 하고 묻는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 하는 답을 줄 수 있는 비엔날레가 돼야 한다. 천연방수, 방부, 방충의 옻칠도막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끌어왔는지, 현대에는 어떻게 재탄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젊은이들에게 낯선 ‘옻칠’이 도리어 더 매력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다.
교육도시, 양반의 도시 청주가 다른 할 말을 접고 ‘공예비엔날레’로 성공을 거둔 것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전통공예로 대변되는 옻칠 말고도 할 말이 많은 통영이지만, 비엔날레는 통영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옻칠’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