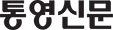인간문화재 김극천 두석장

나무 가구에 들어가는 장식과 경첩, 자물쇠 같은 것을 통틀어 ‘장석(두석)’이라고 한다. 장석은 아름다운 장식의 기능과 함께 가구와 사람을 잇는 핵심 마감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전칠기의 쇠락과 스테인리스의 등장으로 장석은 거의 명맥을 잃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나전칠기를 만들던 통영에서조차 이제 장석집은 단 한 곳, 인간문화재 김극천 두석장(69) 집뿐이다.
뱃속에서부터 장석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태어나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극천 선생은 제64호 두석장 기능보유자다. 그 아들 김진환 씨가 이수자로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김극천 선생의 증조부 김보익 선생은 통제영 12공방에서 장석과 자물쇠를 만들던 ‘두석방’ 장인이었다. 1894년 통제영이 폐영되자, 증조부는 12공방을 나와 따로 공방을 차렸다. 그 가업을 조부인 김춘국 선생이 잇고, 아버지 김덕룡 선생(1913~1996)이 이었다.
장석은 니켈과 주석을 6대 4로 배합해서 만든다. 일본 동전이 니켈이었고, 전쟁 끝나고 굴러다니던 탄피가 주석의 재료였다. 쇳물을 끓이고 녹여서 계속 두드리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서 원하는 두께를 만든 다음에 모양을 낸다. 장석 판을 만드는 시간만 서너 달 걸리니, 3번 장석을 만들면 1년이 지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김극천 선생이 한창 일하던 1970~1980년대, 통영의 나전칠기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다. 덩달아 장석도 쓰임새가 많았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20~30명씩 됐어요. 외지에서 기술자들이 들어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장석을 만들었지요. 소목장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가구를 짰습니다.”

그 무렵부터 장석 재료가 제품으로 나와 쇳물을 녹이고 두드리는 작업은 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공방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기 마련이었다.
“고무신 서너 켤레가 닳도록 장석 집 문턱을 드나들어야 가구가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것 빨리 해달라고 막걸리를 받아다주는 사람도 많았지요.”
장석을 만드는 두석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1980년이다. 두석장의 번호가 ‘제64호’가 된 이유는 당시 기능보유자로 첫 번째 인간문화재가 된 아버지 김덕룡 선생의 나이가 64세였기 때문이다.
“그때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우리 아버님이 ‘나 나이가 예순넷이니 64번 주소.’ 해서 두석장이 ‘제64호 두석장’이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극천 선생은 2000년 7월에 두석장 기능보유자가 됐다. 이수자인 막내아들 김진환 씨는 아예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했다.
하지만 진환 씨를 바라보는 김극천 선생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다. 장석을 만드는 것으로는 밥벌이도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문화재 선정 과정의 여러 불협화음으로 조교 인정이 어려워져, 아들은 지원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에는 가업이고 생업이었지만, 이제는 나 아니면 우리 전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테인리스에 밀려 아주 없어질 뻔했던 주석이나 놋 같은 재료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는 재료가 됐잖아요? 우리 장석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광택을 내는 장석이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첨단시대의 모진 바람 속에서 김극천 선생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장석의 부활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