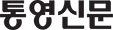스승의 날에 돌아보는 교사-사량초등학교 남정희 교감


40년, 꿈같은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른다.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돌이켜 헤아려보니 교단에 선 시간이 40년이다.
통영에서 나고 자라 교사가 된 남정희 선생은 38년 동안 통영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대끼며 교실에서 생활했다. 2년 전 교감 발령을 받아 사천초등학교에 근무했고, 올해부터 사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교장선생님도 존경할 만한 분이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영국식 가정교사처럼 맞춤형 수업을 하지요.”
남정희 선생이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한 1980년 무렵은 한 반에 아이들이 50명씩 되던 때다. 많은 아이들 통솔하기도 어려웠거니와, 검열과 감시가 일상이어서, 가르치는 방식도 자유롭지 않았다.
“국어 수업 중에 희곡이 있어서, 아이들과 연극을 했어요. 그랬더니 ‘희곡을 글로 가르치면 되지, 왜 연극을 하느냐?’고 질책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에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만났던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의 든든한 방패가 돼 주었다.
“참 꼿꼿한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라’며 교육의 잣대를 제시해 주셨죠.”
그 가르침대로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38년 내내 남정희 선생의 반에는 나머지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 해마다 두세 명씩 교실에 남았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헤어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비해 ‘제자’가 적지만, 이렇게 사랑을 쏟으며 키운 아이들은 중년이 되어서도 찾아오는 ‘제자’가 된다.

남정희 선생이 고등공민학교 영어 교사로 봉사하게 된 계기도 제자와의 인연 때문이다.
옛 통영여학교였던 청년단 건물에 있는 고등공민학교는 전국에 하나 남은 야학이다. 배움에 목마른 중년, 노년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돕고 있다.
한 학생이 “어머니가 공부하는 고등공민학교에 영어 교사가 없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아이들 교과 과정에 영어 과목이 생기면서, 잘 가르쳐볼 욕심에 1년 휴직을 하고 캐나다에 가서 영어공부를 했어요. 아이가 그걸 알고 부탁한 거지요.”
보수도 없고, 교직성적에 가산점도 없는 순수 봉사. 학교에서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저녁에 야학에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 교감 발령 때까지 15년 동안 하게 됐다. 봉사하는 교사가 없어 발을 뺄 수 없었기도 하지만,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는 남정희 선생의 성격도 오랜 봉사에 한몫했다.
교사가 된 첫 해 시작한 자생원 봉사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겁도 없이, 원생들을 데리고 야외놀이를 가면 어떠냐고 원장님께 여쭈었어요. 처음에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40년 전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봉사 방법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제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을 데리고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밖으로 나간다는 발상 자체가 낯선 때였다.
하지만 이십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남선생은 원장님을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고, 통여고 친구들과 결성한 ‘동백회’ 회원들과 프로그램을 짜고, 당시 수산대의 협조를 받아 버스와 운동장을 빌렸다. 버스에 타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 발칙한 아가씨들은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 후 자생원 원장님은, 후원자가 찾아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고 물을 때 “남선생과 의논하세요.” 하게 됐다.
처음 만났을 때 일곱 살이었던 아이들이 마흔일곱 살이 되도록, 남선생은 지금까지 자생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되지도 않는 발음이지만 신문 사설을 소리내 읽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 검정고시 수업 등을 통해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갖추게 한 장애인들도 다수다.
“졸업해 독립한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쁘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월요일, 남정희 선생은 이른 배를 타고 사량도로 간다. 비단 같은 물결위로 아침햇살이 쏟아진다. 반짝이는 윤슬은 아이들 얼굴 같기도 하고, 재잘거리는 목소리 같기도 하다.
아이들보다 서류를 만나는 일이 더 많은 교감 직은 평교사에 비해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남선생은 교사들이 오로지 학생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아이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교사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교생 열네 명의 작은 섬 학교에서, 남정희 선생은 이렇게 학생과 교사를 모두 돕는 엄마로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