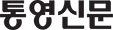통영 강구안 카페 ‘수다’에서 20여 명 참가
신철규 시인 첫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의자만 뒤로 계속 물리면 하루종일 석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너와 나는 이 별의 반대편에 집을 짓고 산다... -신철규 시 ‘소행성’ 중에서-

어떤 소설가는 신철규 시인을 “눈물 한 방울의 무거움으로 등이 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중력’, ‘지구’, ‘행성’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일까? 슬픔과 먹먹함이 침잠해 있는 듯한 그의 시는 독자의 손을 끌고 무거운 언어의 계단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곳에서 ‘인간’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시인의 의도일까?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래,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철규 시인이 문학동네에서 펴낸 첫 시집을 들고 통영을 찾았다. 지난 23일 저녁, 강구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신철규 시인의 시낭송회가 열린 것이다. 시를 사랑하는 통영 시민 20여 명이 함께했다.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책 제목부터 시인은 지구만한 슬픔의 무게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낭송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거창 산골짜기에서 뱀과 개구리를 잡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는 시인의 이야기가 밝고, 건강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에 태어난 젊은 나이이지만, 시인은 일제시대 백석 시인이 쓴 시적 배경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산골에서 곤충과 자연을 벗삼아 어린시절을 보냈다 한다.
“시의 뮤즈는 하나뿐입니다. ‘마감’이죠.”
솔직한 시 창작 이야기에 관중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청탁받은 다음의 갈등, 책 제목을 선정하기 위한 편집자와의 실랑이 등 출판의 뒷이야기도 시인은 맛깔스럽게 풀어냈다.
시인은 ‘소행성’, ‘눈물의 중력’, ‘슬픔의 자전’ 등 시인의 호흡에 잘 담기는 작품들을 낭송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예향의 도시 통영의 젊은이들은 시인이 읽어주는 묵직한 시를 하나씩 가슴에 안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