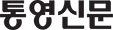늦은 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고 부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 아이가 전화기 속에서 엉엉 운다. 한참을 흐느끼며 울다가 그쳤다가 다시 복받쳐서 울기를 반복한다.
“승현아, 울지 마. 울지 마.”
나는 어찌하지도 못하면서 울지 말란 말만 반복했다. 아이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한두 달 전 딸은 SNS에 건강한 남자의 O형 혈액을 급히 구한다고 올렸고 내게도 수혈할 사람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다. 마흔도 안 된 네일 학원 강사였던 분이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는 망연자실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서면에서 반송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줄곧 울음을 그치지 못했는데, 우는 딸의 전화를 나는 차마 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진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었다고 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냐며 끅끅대며 목소리가 잠기는 아이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울지 마 승현아. 울지 마. 자꾸 울면 힘들어. 울지 마. 응?”
“너무 불쌍해요. 너무 슬퍼요. 안타깝고 믿어지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말 전해주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진짜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이가 들고 탄 쇼핑백을 챙기라는 친절한 기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께서 걱정하실 테니 눈물 훔치고 조금 진정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딸이 내게 물었다. 엄마가 제일 처음 본 죽음은 언제였냐고.
내가 열아홉이었을 때 큰엄마가 돌아가셨다. 나를 너무나 예뻐하셨던 큰엄마는 서울 사람이었는데, 그때 나의 세계에서 서울말을 쓰는 사람은 우리 큰엄마뿐이었다. 우리 미수, 우리 미수라고 부르셨고 뜨개질해서 스웨터, 조끼 같은 걸 짜서 입혀주셨던 분, 돌아가시기 보름 전까지도 내게 계란찜을 해주셨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셔서 손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뇌종양이었다. 돌아가신 큰엄마 곁에서 나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는데, 나보다 더 크게 오열하며 우시던 우리 엄마 때문에, 사실은 내 엄마가 울다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 나는 더 크게 울 수 없었다. 그때 재수하던 큰엄마의 아들, 오빠는 소리 내어 울지도 않았다. 눈물만 주룩주룩 그러다가 무표정, 가끔 주르륵 눈물만 흘리다 삼키기를 반복했다. 그때 오빠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오빠의 얼굴이 더 슬펐다. 나는 그게 죽음인 줄 몰랐다. 실감 나지 않았지만, 세계가 비어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한동안 빈 세상이 둥둥 떠밀려가는 듯한 시간이었다.
아이가 울다 잠들었을 시간이겠지 생각했을 즈음 카톡이 왔다. 걱정 끼쳐 미안하다는 카톡이었다.
‘너에겐 처음 맞이한 죽음이니, 많이 울고 충분히 슬퍼하렴. 좋은 분이셨구나’라고 답톡을 남겼다.
-고맙습니다. 내 딸의 선생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어린 나에게도, 스무 살인 딸에게도, 처음 맞이한 죽음은 낯설었고 슬픈 기억이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도 적응하고 만만하게 다가올 리는 없지만 슬픈 것을 슬프다고 한없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