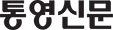고향 내음 가득한 서울 속의 작은 통영

서울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 방배동에 작은 통영이 있다. 박병기(67)·이복자(66) 부부가 운영하는 ‘통영 바다풍경’ 식당이다. 이곳에서는 도다리쑥국, 물메기탕, 멍게비빔밥 같은 통영 계절음식과 나물비빔밥, 멸치쌈밥, 충무김밥, 방아전 같은 통영향 가득한 음식을 판다. 동네맛집으로도 소문나, 올해 3월엔 KBS 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161회차에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에는 매일 새벽 통영에서 직송되어 올라오는 싱싱한 해산물로 정통 통영식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영뿐 아니라 경남의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의 맛이 생각날 때 찾는 집이니, 바다풍경에서 파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향이다.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방송이 나온 다음날 통영에 도다리쑥국 재료가 동났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통영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서울 속에 통영을 만들고 있었지만,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통영의 맛을 대표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김영철 씨는 통영의 맛에 감탄하며 엄지척을 해보였다.
박병기 대표의 꿈은 김영철 씨에게 통영을 소개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통영과 통영의 맛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강석주 시장으로부터 ‘통영시 관광홍보 대사’ 위촉을 받기도 한 박병기 대표는 현재 재경통영시향우회 간사와 재경경남도민회 이사로 봉사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명장으로만 홍보대사가 아니라 진짜 통영의 맛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초가 사람의 몸에 얼마나 좋은가, 그중에서 통영의 해초는 얼마다 더 특별한가 하는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냥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좋다고 하고, 그냥 맛있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맛을 보여주면서 통영을 알리고 싶은 것이지요.”
해초가 몸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해초 중에도 특히 통영의 해초는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특별한 풍미를 지녔다. 도서관에서 서적들을 뒤지며 그는, 적당한 염분의 바닷속에서 침잠을 반복하며 자라는 해초에 더 많은 영양과 맛이 있다는 결과들을 확인했다.

‘어릴 적 나도 물이 나기만을 기다려 해초를 캐곤 했었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풍화리 함박섬에서 자란 그는, 물때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해초들이 더 싱그럽게 영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신선한 해초와 해산물을 더 많은 사람의 밥상에 올리는 일은 더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 그는 이런 확신으로 식당일 틈틈이 잊혀져 가는 통영의 추억 음식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부부가 방배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11년 전이다. 가게를 차리고 처음 손님을 맞던 날, 박병기 대표는 앞치마 속에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맸다.
“그때도 나이가 좀 있었죠.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직장인들에게 서빙을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맸죠. 그러자 정중한 매너로 서빙하겠다는 마음이 잡아지던데요.”
식당은 통영에서 나고자란 그들 부부가 처음 만나 시작한 일이다. 스물넷, 스물셋 꽃 같던 젊은 부부는 통영 중앙시장에 있는 작은 일본식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아리랑밥집. 겨우 테이블 두세 개가 놓였을까, 1층은 가게였고, 2층 일본식 다락방은 살림집이었다. 옹색했지만 행복했고 희망이 있었던 보금자리였다.
“열심히 살았죠. 가게를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통반장도 하고 동창회장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손맛이 있었고, 저는 친절함이 있었으니까요.”
인평동 수대 캠퍼스 옆, 북신동 등으로 옮기며 부부는 20년 동안 식당을 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자대리점을 하게 된 것이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무슨 일이든 그 분야를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친절하게 물건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쉬운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필 그 무렵 IMF가 덮쳤다.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에서 퍽퍽 쓰러지던 때였다. 그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통영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인천에 있는 형님을 언덕 삼아 고향을 떠났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단돈 200만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면서 공사장에서 밥을 해주었습니다.”
전셋집을 얻고 아이들을 부르고 집을 사고 가게를 열기까지… 가족은 서로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며 비바람을 견뎠다.
“내가 많이 아파 보니 아픈 사람들 마음을 더 알겠고, 봉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에, 그는 지금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서초구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그 또한 서울 속에 통영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서울 방배동에 통영 바다 향이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