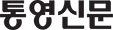이승기 목사
② 동성애의 본질, 뽀뽀와 키스 사이
(교정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필자의 건의에 의해 일부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편집자 주)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인의 성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자답다거나 여자답다는 말은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낸 것일 뿐, 부드러운 성품에 선이 가는 외모를 가졌다고 해도 그의 염색체가 XY이면 남성이라고 여기는 인식이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들어,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란 ‘동성 간의 성행위’에 국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성관계가 없는 애정과 사랑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성경은 그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성애는 육체적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 짓는 기준은 성적인 관계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창시절, 남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거나 서로의 어깨를 껴안고 무등을 타며 몸을 부딪치며 살았다. 때로는 친구의 아픔에 진한 공감을 느끼기도 하며,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기도 하고, 우정을 위해 주먹질을 불사하기도 했다. 더 철이 없을 때는 누가 더 멀리 소변을 누는가를 내기하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 부르는가? 만약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동성애라 부르는가?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학생들은 친구끼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며 걷는다. 좋아하는 친구가 울면 같이 울고, 친구가 당한 일에 함께 분노한다.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해 보이면 질투도 하고, 더 친해 보이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한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은 칸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단짝친구도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 부르는가? 만약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동성애라 부르는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 결국 우정과 사랑은 성적인 끌림으로 구분된다. 어떤 순간, 격하게 끌어안고 뽀뽀를 한다 하더라도 성적인 끌림이 없는 애정표현이 있고, 손끝 하나 대지 않더라도 성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남녀 간에도 친구인지 애인인지 애매한 시간을 보낸 연인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관계의 정리는 결국 성적인 끌림과 관계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밤새 같이 술을 마시고 어깨동무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남녀동지(?)들이 그저 ‘남사친(남자사람친구)’인지, ‘남친’인지는 뽀뽀와 키스 사이에서 결정된다. 우정 관계에서는 뽀뽀와 구분되는 의미로서의 키스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하는 문제는 철저히 ‘성애’에 대한 구분이다. 동성 간에 성애를 하는가, 이성 간에 성애를 하는가의 구분인 것이다. 우정과 신뢰, 사랑, 정신적인 교감을 금지할 법이나 사회적 편견은 없다.
그러니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는 성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말은 그들의 우정과 정신적인 사랑을 보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적 취향’을 보장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다고?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 하더라도, 성적 취향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소수가 갖는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다수로부터 압박과 따돌림을 받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떠한 형태이든 성적 취향은 다양성의 하나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적 취향을 갖지 말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까지 말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더구나 그러한 성적 취향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던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줄 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