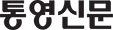소설 ‘통영’ 펴낸 반수연 작가

“고향이 싫었다. 철들고부터는 고향을 떠나는 것만이 꿈이었다. 원대로 지구 반대편에 정착했고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나는 매일매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쩌면 진작에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통영 출신의 소설가 반수연 씨(56)가 첫 소설집을 냈다. 제목은 ‘통영’. 이 책은 지난달 말 출판되자마자 2주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가 바로 2쇄를 찍었다. 1쇄만 찍고 사라지는 책이 수두룩한 출판시장에서 놀라운 일이다.
이 책에는 신춘문예 당선작인 ‘메모리얼 가든’을 비롯해 ‘혜선의 집’(2020년), ‘나이프박스’(2018년), ‘사슴이 숲으로’(2014년) ‘통영’(2015)의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4편, 현대문학에 실린 ‘국경의 숲’, 리토피아 겨울호에 실린 ‘자이브를 추는 밤’이 실려 있다.
단편소설이라 서로 다른 이름과 상황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북미지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향을 떠났으되 타향에 정착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날마다 고향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제목으로 사용된 ‘통영’은 그를 낳고 기른 가족과 고향, 고국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저로서는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집을 낸다는 게 무겁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통영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소설이 통영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출판사와 논의를 하면서 ‘통영’으로 하기로 했지요. 출판사 대표님은 ‘통영’이라는 말에는 고향 같고 이상향 같은 이미지가 있으므로 지협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주인공들이 통영을 향하고 있으니 상징성도 있다며 제목을 결정했지요.”
작가는 소설집 말미의 ‘작가의 말’에서 “통영, 내 모든 작품이 그곳을 향해 있더라는 말씀을 듣던 날, 나는 노트북 위에 얼굴을 묻고 조금 울었다. 그곳이 내 고향이 아니었다면 나는 소설 같은 건 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썼다.
반수연 작가는 서호시장 ‘딱정집’에서 자랐다. 집 앞에는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일상적인 배경처럼 파도소리가 들렸다.
“2남 4녀 중 막내예요.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내가 살던 서호시장 딱정집은 공중변소를 같이 쓰는 곳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거기 사는 애들은 장돌뱅이들이라고 무시했는데,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시장판 엄마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요.”

그래서였을까? 반수연 작가는 통영을 떠나는 것만이 꿈이었단다. 그 꿈이 이루어져, 그는 1998년 캐나다 벤쿠버로 이민을 떠났다.
“이민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둘째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가 백일이 되었을 때쯤 통장의 잔고를 모두 끌어모아 식당을 차렸어요. 손님은 참 더럽게 없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팔릴지 말지 모르는 식재료를 매일 다듬었고, 나는 출입문을 바라보며 올지 안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렸지요.”
그 시절 그는 늘 막막하고 오래 실패한 기분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 한국소설을 읽기 시작했단다. 독서가 깊어지면서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그는 “회피라고 해야 할까, 도망이라고 해야 할까,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 그걸 기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까? 내 소설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표현했다.
놀랍게도 벤쿠버에서 보낸 소설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그 후 몇 년간 공백기를 보낸 반수연 작가는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민 오지 않았으면 소설 같은 건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움’이라는 병을 앓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민 초기, 그는 집에서 30십 분쯤 걸리는 바다까지 밤에 달려가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캄캄한 밤에는 고향 바다인지 낯선 바다인지 구별이 안 돼 꼭 고향에 온 것만 같았다.
그는 4~5년마다 한 번씩 고향을 찾았다. 고향은 언제나 그립고 애달픈 곳이었다.
지난달, 그는 첫 소설집 발간에 맞춰 고향을 찾았다. 국경마다 코로나19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했지만, 첫 소설집이 발간되는 곳에 목격자가 되어야 했다.
자가격리 해제 시간에 맞춰 책 출판 날짜가 되도록 일정을 잡고 통영의 푸른 바다를 표지로 하고 있는 책을 받아들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책을 내보고 싶어하는 ‘도서출판 강’에서 출판했다. 출판사 대표님은 통영에 들어서면서 “톨게이트에 책 제목이 적혀 있더라.”며 농을 쳤다.
반수연 작가는 당분간 거제에 있는 언니 집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을 작정이다. 이달 22일에는 용인 아름다운 숲 속에 있는 ‘생각을 담는 집’에서 북콘서트도 한다.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은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살기로 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최초의 문학 전문 창작공간이다. 서대문구에 있던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11월에 개관, 분기별로 상주작가를 선정해 작품활동에 매진하도록 돕고 있다.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낸 소설을 쓰고 싶어요. 특히 통영은 대도시와 달라 익명으로 살 수 없는 도시잖아요. 한 집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통영을 배경으로 한다면 더 밀도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첫 책은 ‘이력서’와 같다. 반수연 작가는 등단 후 16년의 침묵이 ‘글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이력서를 써냈다. 혹자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박경리를 떠올렸다 한다. 통영이 또 하나의 별을 내놓은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