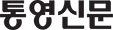주길자 여사

“인제는 넘 생각 고마하고 닐로 위해 살아라.(이제는 남 생각 그만 하고 너를 위해 살아라.)”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도록 배려하고 버스에 앉아서도 벌떡 일어나 양보하는 주길자(81) 여사에게 친구가 하는 말이다. 친구는 “이제는 우리도 늙었고 사회의 배려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어쩌면 한참 전부터 그런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냥 이제껏 살아온 습관대로 내게 주어진 몫의 일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모른다.
주길자 여사는 통영의 유명한 봉사단체였던 할머니회의 회장을 11년 동안 지냈다. 1974년에 창립해 40여 년간 모자세대, 보육원들을 돕고 곳곳에 봉사의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돕던 할머니회는 2005년 주길자 여사가 회장을 맡으면서 요가와 노래 교실 등 문화단체의 역할도 하다가 2015년 통영시에 회관을 기부하며 해체했다.
새마을 부녀회 일도 수십년간 보았고 회장도 오랫동안 지내와, 주길자 여사의 이름은 그냥 “회장님”이다.
“새마을 부녀회 일을 할 때는 참 바빴어요. 도로 가의 가드레일도 일일이 닦고, 한산대첩 축제도 마을 단위로 준비해 퍼레이드를 했어요. 합창단 활동도 하고 즐겁게 지냈지요.”
태평동 대표로 가장행렬 1위를 했던 것, 통영시 대표가 되어 진주 합창대회에 출전해 1등을 했던 것 등 돌아보면 즐겁고 치열했던 젊은날이었다.

오랫동안 주길자 여사의 봉사활동을 지켜봤던 지난 중앙동장은 “회장님은 일손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나 두말없이 달려와 가장 먼저 봉사의 일선에 서셨다.”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고 가정이 평안해 봉사를 잘하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주길자 여사는 누구보다 눈물겹고 아픈 삶의 길을 걸어왔다. 오히려 남을 위한 봉사로서 자신의 아픔을 견뎌왔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것이다.
“아홉 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해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 어머니는 잘 웃지도 않고, 좀 차가운 편이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청소년 때 가출을 몇 번씩 하며 자랐지요.”
친엄마가 동생을 낳은 산후통으로 돌아가신 것이어서 일찍 계모가 들어왔던 것이리라. 그러나 사춘기 소녀에게 웃음 없는 계모는 멀기만 한 존재였다.
빨리 내 가정을 갖고 싶었던 주길자 여사는 친척의 소개로 스물한 살에 나전칠기 하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당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는 멋쟁이였다.

자녀가 많은 유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주길자 여사는 3남 2녀를 낳았다.
손주 두세 명을 안아보았을까? 아버지는 새댁일 때 돌아가셨다. 그리고 결혼 10년이 채 안 돼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
“과시욕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당시 남자들은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사는 일이 꽤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야 담담하게 말하지만, 서른 살 젊은 새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계모에게 어린 큰딸과 막내를 맡기고, 남편을 찾겠다고 대구시내를 뒤지며 다닌 세월이 2년여였다. 방학이 되면 큰딸이 막내를 데리고 대구로 왔다가 개학을 하면 통영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어렵게 수소문해서 만난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어린 딸을 낳고 살고 있었다.
남편을 포기하고 다시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 올망졸망한 다섯 자녀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화장품 장사, 쌀장사, 닭꼬치 장사를 하며 애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애들이 착하고 예의가 발라 바깥일을 할 수 있었지요. 큰딸이 동생들 건사하며 살림을 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착한 자녀들에게 “큰소리로 웃지 마라, 맨발 내놓지 마라.” 등등 몸가짐을 정숙하게 하기 위한 잔소리를 많이도 했다. 가정교육 안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는 안간힘이었을 터다.
주길자 여사의 봉사는 이런 눈물 속에서 시작됐다. 1977년 태평동 반장을 시작으로 1979년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봉사의 삶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장사를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다섯 아이를 돌보는 가장이 무슨 봉사란 말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뜻밖에 그 속에서 힘을 찾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이 봉사하는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찾게 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80년대에는 부녀회가 할 일이 참 많았다.
“한번은 충무시 대표로 보름 동안 전국대회에 참가했어요. 각 지방 새마을회에서 자기 지방의 향토음식을 자랑하고 판매하는 대회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무김밥을 팔았어요. 그때 태풍 셀마가 왔는데,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엄마도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요.”
따져 보니 1987년이다. 그렇게 주길자 여사는 아이들 다섯을 홀로 키우면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힘으로 모진 세월을 지내왔다. ‘장한 어머니상’을 비롯한 숱한 수상과 표창은 그 힘겨운 걸음에 대한 작은 격려일 것이다.
요즘 주길자 여사는 노인일자리로 전봇대에 붙은 광고지를 떼고 다닌다.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돌아보면 봉사는 사람을 얻게 하고 나를 지탱해 준 힘이었는지 모른다.